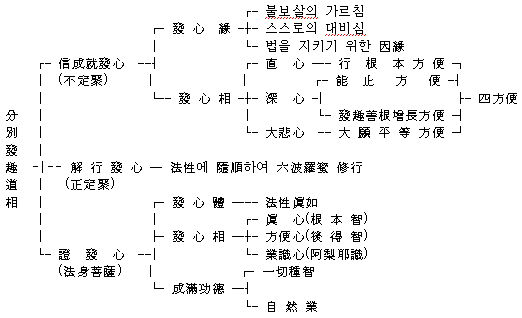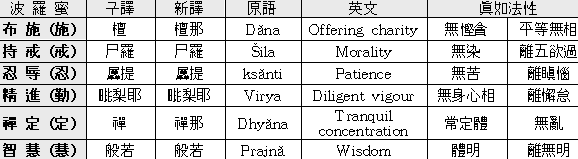① 止門(지문) 지(止)의 수승한 공능을 밝힘
若修止者(약수지자) 住於靜處(주어정처) 端坐正意(단좌정의) 不依氣息(불의기식)
만일 지를 수행하는 자라면, 고요한 곳에 안주하여 단정히 앉아 의식을 바르게 해야 하고, 호흡을 의지하지 말며,
不依形色(불의형색) 不依於空(불의어공) 不依地水火風(불의지수화풍)
형상과 색상에 의지하지 말며, 허공을 의지하지 말며, 지·수·화·풍을 의지하지도 말며,
乃至不依見聞覺知(내지불의견문각지)
나아가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見聞覺知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元曉 : 靜處(정처) - ① 숲과 같이 고요한 곳. ② 생활을 깨끗이 함(持戒). ③ 의식(衣食)이 넉넉할 것(小欲知足 필요). ④ 선지식을 만나야 함. ⑤ 번거로운 반연을 쉼(사람을 만나지 말 것)
* 지운 : 좌선의 자세 - 오른발을 왼발 위로 하고 왼손을 오른손 위로 한다.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약간 뺀다. 시선은 코끝을 향한다. 혀끝을 입천장에 붙인다.-물처럼바람처럼]
[여기서는 지(止)의 수행방법 즉, 좌선(坐禪)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본론의 목적인「진여의 관찰」즉 진여삼매(眞如三昧)에 들어가는 것을 밝히고 있다.
먼저 수지(修止)의 방법으로서「지(止)를 닦는 자는 고요한 곳에 머물며,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한다」고 설한다. 단정히 앉는다는 단좌(端坐)는 결가부좌(結跏趺坐) 또는 반(半)가부좌하여 몸을 바르고 곧게 앉는 것을 말하며, 정의(正意)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자타(自他)를 무상도(無上道)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갖는 것을 말한다. 선정(禪定)의 방법에 있어「기신론」은 원시불교이래 설해지는 방법을 부정하고 있다.
「不依氣息 기식(氣息)에 의하지 않는다」, 원시불교에 있어서는, 호흡을 헤아려 마음을 통일하는 수식관(數息觀)이 있으나,「기신론」은 유식관(唯識觀)에 의하여 진여삼매(眞如三昧)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전통적인 선(禪)수행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不依形色 형색(形色)에도 의하지 않는다」는 신체의 부정(不淨)을 관하는 부정관(不淨觀)과 해골(骸骨)을 관하는 골쇄관(骨 觀)등을 말한다. 우리의 탐욕을 없애기 위하여 관하는 법이다.
不依於空 不依地水火風, 일체는 공(空)이라는 관법이나 지수화풍(地水火風)이라는 관법은 사정(事定) 즉 색정(色定) 무색정(無色定)에 들어가는 선정방법의 하나를 말한다.
흩어진 마음에서 보고 듣는 육진(六塵)의 일체는 의식(識)의 소산(所産)이라고 관하는 견문각지(見聞覺智) 등 원시불교에서 행하는 전통적 선정(禪定) 방법에 의하지 말 것을 설하고 있다.
이들 관법은 외계에 사상(事象)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관(觀)함으로써, 마음의 통일을 수행하는 방법이나,「기신론」은 유식관(唯識觀)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관(事象觀)을 취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본론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헤아리는 기식(氣息)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는 해골과 뼈와 그 밖의 더러운 육체라는 부정관(不淨觀)등 형색(形色)에 의하지 아니하며 공(空)이니 지수화풍(地水火風)이니 또는 보고 듣고 아는 의식이나 관념 등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온갖 상념(想念)을 그 상념이 생기는 찰나 찰나에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더욱이 그 상념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그 상(想) 자체마저 역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일체법은 본래 무상(無相)으로서 찰나찰나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한 찰나찰나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일체는 유심소작(唯心所作)으로서 마음의 본성은 본래 무념(無念)이므로 이 법성무상(法性無相)의 이(理)에 도달되면, 일체법은 본래 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 밖의 경계를 인정하면서, 그 후에 마음에 의하여 마음을 제거하는 그러한 방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 외경(外境)에 집착하여 산란해지면, 그 산란한 마음을 가다듬어 정념(正念)에 들게 하여야 한다.-금강사]
["住於靜處 고요한 처소에 안주한다"= 외부의 조건이 심난하고 시끄러운 처소를 버리는 것입니다. 천태의 '소지관(小止觀)'에선 선정에 들어가는 시초에 우선적으로 조신(調身)·조심(調心)·조식(調息)을 배우라고 밝혔는데, "端坐, 단정히 앉는 것"은 몸을 고르게 하는 조신에 해당하며, 자세를 앞으로 숙이지도 않고 위로 바짝 쳐들지도 않기 때문에 "단정히 앉는다"고 합니다.
"正意, 의식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고르게 하는 조심입니다. 마음이 혼침에 빠지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아서 성성(惺惺)하고 적적(寂寂)함이 쌍으로 흐르기 때문에 "의식을 바르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호흡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은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과 형체와 색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집착을 여읜 것이고, "오대(五大)인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의 집착을 여읨이며, 不依見聞覺知 보고 들어 지각한 경험적인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마저 여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선덕(禪德)께서 말하길, "안으로는 몸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밖으로는 세계를 버려라. 모름지기 망상인 심의식(心意識)을 떠나서 참구하고, 범부·성인이라는 상대적인 길에서 벗어나 배우며, 망상과 그 경계를 떠나서 참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不依, 의지하지 말라"고 한 이 모든 말은 고덕이 말씀한 "벗어남"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수선]
一切諸想(일체제상) 隨念皆除(수념개제) 亦遣除想(역견제상)
일체 모든 상념을 생각을 따라 모두 제거하되, 역시 제거한다는 일념마저도 버려야 한다.
[지운 ; 隨念(수념) - 알아차림을 말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려 이를 버리되, 버렸다는 생각도 버린다.]
以一切法本來無相(이일체법본래무상) 念念不生(념념불생) 念念不滅(념념불멸)
일체법은 본래 상념이 없어서 생각 생각이 나지 않으며, 생각 생각이 사라지지도 않으니,
亦不得隨心外念境界(역불득수심외념경계) 後以心除心(후이심제심)
또한 마음이 밖으로 경계를 생각하는 것을 따르지 않은 뒤, 마음으로써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일체 경계가 무상(無相)임을 알게 되면 그 경계를 생각하는 것에 따르지 않게 된다.
* 지운 : 以心除心(이심제심) - 뒤의 마음은 동요하는 마음이고, 앞의 마음은 바르게 하는 마음으로, 正知의 힘으로 동요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心若馳散(심약치산) 卽當攝來(즉당섭래) 住於正念(주어정념)
마음이 만일 치달아 흩어진다면 마땅히 당장에 거두어 들여 정념에 안주해야 하며,
是正念者(시정념자) 當知唯心無外境界(당지유심무외경계)
이 정념이란 것은 오직 마음일 뿐 외부의 경계란 없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만 하나니,
旣復此心亦無自相(기부차심역무자상) 念念不可得(념념불가득)
곧 다시 이 마음까지도 또한 자체의 모습이 없으므로 생각 생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지운 : 最極寂靜(최극적정) - 주객이 하나가 되는 상태이나 혼침과 들뜸으로 인해 끊어짐이 있다.]
[정념(正念)이란 유심무경(唯心無境) 즉 오직 마음에 의한 것으로서 마음 밖의 경계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마음에 자상(自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체는 진여(眞如)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찰나 찰나의 마음을 인식하는 한, 그것은 아직 유심(唯心)의 이치에 이르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정념(正念)에 주하게 되면, 마음은 염념(念念)으로 불가득(不可得)인 것이다. ]
[ "일체 모든 상념"으로부터 "상념마다 사라지지 않는다"까지의 다섯 구절은 마음 쓰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일체 중생은 근본 진심을 미혹하고 한결같이 망상에 의지하는 측면에서만 멋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止)방편문을 수습하여 망상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최상을 삼았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능가경'에서는 "위로부터 모든 성인들이 서로가 전수했던 것이 망상엔 자성이 없다"는 이 한 마디 말로써 정확한 요점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상에 자성이 없다면 어떻게 망상을 제거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心若馳散 卽當攝來, 일체 모든 상념을 상념이 일어나는 그대로 따라서 제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념이란 직심으로 진여법을 올바르게 염하는 일념입니다. 지금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일념만을 홑으로 이끌어내어 그것만을 위주로 하고 다시는 제이념(第二念)이란 없습니다. 이 일념이 망상무성(妄想無性)의 진여법을 관조하는 힘으로써 망상이 일어나는 곳을 보기만 하면 그것을 따라서 즉시 일념을 관조하고 타파하여 그 자리에서 소멸시키고 다시는 분별망상이 상속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가대사(永嘉大師)가 말한 "상속하는 분별심을 끊는다"는 것에 해당하겠습니다. 참선하는 요점이 이 일념을 벗어나지 않는 그 요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隨念皆除 亦遣除想, 또한 제거했다는 일념마저 버린다"는 상념을 제거하는 주관적인 일념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최초의 일념으로써 상념을 제거하여 망상의 상념이 사라지고 나면 바로 이 주관적인 일념까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할 객관인 상념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이 일념마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올바른 생각인 정념(正念)이라고 말하였다면 또 무엇 때문에 그 정념마저 버려야 하느냐 하면 이 주관적인 정념의 일념은 객관의 상념을 버리기 위해서 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립되었을 뿐이므로 진여일심의 자체는 본래 망상을 여의었는데 또 무슨 주관적인 일념인들 용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본래 망상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망상이 이미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가령 일념을 수립하여 망상을 상대한다면 다시 그 일념은 망상의 근본이 되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이 일념마저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여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과 망상이 함께 끊기고 주관과 객관을 모두 다 잊은 것을 정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념마저 성립하지 않으면 상념마다 나온 실재가 없게 되고, 상념마다 생멸의 인연으로 나온 실재가 없다면 상주하는 광명이 목전에 나타나고 실지의 고요와 권지(權智)의 관조가 환하여 상념마다에서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이것이 참선하는 확실한 종지입니다.
"亦不得隨心外念境界 後以心除心, 마음 밖으로 생각하는 경계를 따라서, 그런 뒤에 마음으로써 마음을 제거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을 잘 쓰지 못하는 병통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일념으로 관조한 힘으로써 다시는 망상을 따라 마음이 구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 망상을 따라 밖으로 경계를 생각한 뒤에, 도리어 마음으로써 마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계를 제거한다면 이는 주관적인 망상으로써 객관의 모습인 망상을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생멸하는 망상을 쫓으면서 생사에 유전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마음을 썼다간 끝내 생멸하는 망상을 여의지 못하게 되므로 이야말로 마음을 잘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만일 마음이 경계로 치달아 흩어지면 그 자리에서 거두어 들여 정념으로 귀결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망상은 나오자마자 바로 그곳에서 즉시 망상이 성공(性空)한 이치를 관조하고 망상을 타파하여 그를 따라서 마음이 구르지 않으면, 정념으로 귀결하여 마음이 외부의 경계의 반연을 따르길 기다린 뒤에야 그것은 망상분별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두어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제시하여 알아야 할 것은 '當知唯心無外境界, 경계가 마음의 모습일 뿐 마음 밖에 실재하는 경계란 없다'고 하였고, 밖으로 마음의 양상인 경계뿐만 아니라, 다시 안으로 이 마음까지도 역시 자체의 양상이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념마다 그 실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의 마음과 밖의 경계에서 일체의 번뇌가 고요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상념마다 훈습하여 수행한다면 자연히 진여를 체득하고 그와 하나로 계합(契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즉지지관(卽止之觀)입니다.]
若從坐起(약종좌기) 去來進止(거래진지) 有所施作(유소시작)
만약 앉은 곳에서 일어나 가고 오며, 나아가고 멈추며, 행하는 바가 있다면,
於一切時(어일체시) 常念方便(상념방편) 隨順觀察(수순관찰)
일체의 시간에 항상 방편을 생각하여, 수순하고 관찰하여
久習淳熟(구습순숙) 其心得住(기심득주)
오랜 동안 익혀 익숙하여지면 그 마음이 안주할 수 있다.
[여기에 이르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 지운 : 專住一趣(전주일취) - 주객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끊어짐이 없으나, 외부 자극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 벗어남.]
以心住故(이심주고) 漸漸猛利(점점맹리) 隨順得入眞如三昧(수순득입진여삼매)
그 마음이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맹렬하게 날카로워져서 수순하여 진여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
深伏煩惱(심복번뇌) 信心增長(신심증장) 速成不退(속성불퇴)
번뇌를 깊이 조복받고 신심이 더욱 자라나 신속하게 불퇴전을 성취한다.
[지운 : 等持(등지) - 정진의 힘으로서 아니라 숙달된 상태로서 비록 외부 자극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다.]
[만약 좌선(坐禪)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좌선 이외의 행주좌와(行住坐臥) 등 여러 가지 행동, 즉 가고 오고 나아가고 머무는 거래진지(去來進止)의 경우에도 언제나 항상 마음을 집중하는 지(止)의 방편을 잊지 않도록 염하여 법성부동(法性不動)의 이치를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편을 오래 익혀, 순수하게 성숙해지면 마음은 정념에 들어 득주(得住)하게 되는 것이므로, 마음을 집중하는 지(止)의 힘은 더욱 맹렬해져서, 그것을 따름으로서 진여삼매(眞如三昧)에 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번뇌를 깊이 굴복시키고 신심을 증장시킬 수 있게 되어, 물러서지 않는 신심을 속히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唯除疑惑(유제의혹) 不信誹謗(불신비방) 重罪業障(중죄업장)
오직 의혹하는 것과 불신하는 비방과 중죄업장과
我慢懈怠(아만해태) 如是等人(여시등인) 所不能入(소불능입)
아만, 게으름하는 사람은 제외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원효 : 九住, 《瑜伽師地論》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 사마타관
① 內住(내주) - 경계에 반연하는 것을 거두어 안에 묶어두고 바깥으로 어지럽지 않음. 不依氣息 不依形色 不依於空 不依地水火風 乃至不依見聞覺知
② 等住(등주) - 번뇌에 묶인 마음의 성품이 거칠어 모든 경계에 두루 평등하게 머물 수 없어서 차례대로 이것이 인연한 경계에 마음의 집중이 이어지게 하는 방편과 맑게 하는 방편으로 미세하게 두루 감싸 머물게 함. 一切諸想 隨念皆除
③ 安住(안주) : 내주와 등주를 했더라도 집중력을 잃게 하는 마음에 있는 작용으로 밖으로 어지럽게 되면 그 마음을 거두어 안의 경계에 편안히 둠. 亦遣除想
④ 近住(근주) : 먼저 내주와 같은 마음에 맞추고 생각을 모아 머무는 마음을 가까이 하고 생각을 모은 마음으로 자주 주의를 기울여 안에 마음을 머물게 하여 바깥에 멀리 나가지 않게 함. 以一切法本來無相 念念不生 念念不滅
⑤ 調順(조순) : 온갖 모습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 즉 색석향미촉법의 경계, 탐진치의 마음, 남녀의 차별이니 비구는 먼저 저 모습이 근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커짐으로 모든 모습에서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함. 亦不得隨心外念境界
⑥ 寂靜(적정) : 온갖 욕심과 성냄, 해치려는 마음과 같은 나쁜 심사(尋思)와 탐욕과 같은 모든 수번뇌(隧煩惱 : 근본번뇌에 따라 일어나는 번뇌)가 마음을 움직이므로 그 모든 법들이 근심이라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커짐으로 나쁜 심사와 수번뇌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음. 後以心除心
⑦ 最極寂靜(최극적정) : 집중력을 잃게 하는 마음에 있는 작용으로 나쁜 심사(尋伺)와 수번뇌가 잠깐 일어날 때, 비구의 마음이 일어나는 곳을 따르지만 번뇌는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물리침. 心若馳散 卽當攝來 住於正念 是正念者 當知唯心無外境界 旣復此心亦無自相 念念不可得
⑧ 專住一趣(전주일취) : 열심히 수행하는 힘이 있어 마음의 집중이 이어짐. 若從坐起 去來進止 有所施作 於一切時 常念方便 隨順觀察 久習淳熟 其心得住
⑨ 等持(등지) : 자주 닦아 익힌 공부의 인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이 흘러가는 인연 속에 도가 굳어짐. 以心住故 漸漸猛利 隨順得入眞如三昧 深伏煩惱 信心增長 速成不退
* 고순호 : 疑惑(의혹) - 과연 그럴까 하는 것. 不信(불신) - 이러한 도리를 믿지 않는 것. 誹謗(비방) -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비방하는 것, 즉 외도. 我慢(아만) - 자기 생각과 배운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것, 懈怠(해태) - 게을러서 미루거나 정진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지운 : 삼매에 대해 혼침이 있는가 없는가로 참다운 삼매에 들었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아를 체득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람은, 지(止)를 완성할 수가 없다. 즉 진여를 의혹(疑惑)하는 자, 즉 의심이 있으면 마음이 산란해져 하나로 통일 할 수 없는 것이며, 불신(不信)하는 자, 믿음이 없으면 역시 그러하며, 비방(誹謗), 즉 정법을 비방하는 자도 지(止)를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오역(五逆)을 범하는 등의 중죄(重罪)의 업장이 있는 사람이나, 아만(我慢) 즉 자기에 대한 자만심이 강한 사람, 해태(懈怠) 즉 게으른 사람들은 진여삼매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 수행자가 앉아 있을 때는 지(止)를 닦을 뿐만 아니라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거래(去來)하고 나아가고 멈추면서 하는 일이 있거든 일체의 시간에 항상 지방편(止方便)을 사유하여 움직이지 않는 진여법성의 도리를 수순하며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수습하여 순일하게 익숙하여지면 그 마음이 지방편을 성취하여 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맹렬하고 날카로운 선정을 얻어 진리의 본성을 수순하면서 진여삼매에 깨달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번뇌를 깊이 조복받고 신심이 더욱 자라나 십신(十信)이 원만해지면 십주(十住)와 십지(十地)에 들어가 신속하게 불퇴전(不退轉)의 경지를 성취하게 되나, 오직 진여의 이치에 망설이면서 의혹하는 것과 불신하는 일천제(一闡提)와 비방하는 외도(外道)와 오역사중(五逆四重)의 중죄업장(重罪業障)과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뽐내는 아만(我慢)자와 방일하여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섯 종류의 장애 가운데서 하나의 장애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깨달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편수연지(方便隨緣止)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지(止)란 항상 단정히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을 따라 닦고 익히면서 잠시도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찰을 오래 하고 나서 차츰차츰 순일하게 익숙해지면 그 마음이 자연히 진여삼매에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번뇌를 점차 조복받고 신심이 더욱 자라나게 되면 신속하게 불퇴전의 경지를 성취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삼매는 십신(十信)을 능히 원만하게 성취하고 십행(十行)을 행하려는 자라면 모두가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불신하는 마음으로 악업의 장애를 중지하고 아만을 부리는 자는 제외되어, 그들은 깨달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 근기로써 그 반대인 유일하게 십신을 성취해야만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불법의 큰 바다엔 신심(信心)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신심(信心)은 도(道)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이란 삼세를 이어주고 무한한 우주로의 확장을 시켜주는 바탕입니다. 우선 내 자신의 진여불성의 자성을 믿고 그러한 불성자성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자가 다 진여법성의 나타남임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성(佛性)이요, 우주의 존재들에 있어서는 법성진여입니다.-수선]
[“지관을 수순한다는 말은 모든 경계를 그치고 정관의 지에 따르는 것이다. 관관을 수순한다는 것은 인연관을 분별함으로써 정관의 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아홉 가지 심주, 네 가지 혜행으로 수순한다.” 심주란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지(止)를 하려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알아야 합니다.
선정의 단계를 살펴보면 “초선(初禪)에서는 각(覺)과 관(觀)으로써 욕계의 악을 떠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말을 멸한다. 이선 (二禪)에서는 각(覺)과 관(觀)이 쉬고 마음의 평정을 취하여 정(靜)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감각과 관찰이 멸한다.” 각(覺)이란 번뇌망상의 경계에 따라 분별된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관(觀)은 관찰, 관조함으로써 기본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계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항상 공존하나, 악한 마음이 좀 더 강해서, 우리는 분별에 의한 자기 이기에 따라 살아갑니다. 선정을 하면 이 악한 마음에서 떠나 기쁨과 즐거움 이 생깁니다. 고에서 벗어나 낙으로 가기 위해서 욕계의 악한 마음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의 기쁨이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초선을 얻을 때 말을 멸한다는 것은 선정에 들면 말이 자연스럽게 없어 지는, 묵언이 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록 오염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사선의 상태가 되면 견성입니다. 지혜가 열립니다. 이선에 들어오면 감각과 관찰이 멸합니다.
“삼선(三禪)에서는 공(空)에 머물러 즐거워함으로 제3선을 얻는데 3선을 얻을 때는 기쁨을 멸한다. 사선(四禪)에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멸하고 맑고 깨끗함이 있는 정념(淨念)을 통해 근본 자리에 들면 제4선을 얻는데, 4선일 때는 숨결이 멈춘 다.” 공에 머무른다는 것은 현상으로부터 벗어나 허공, 청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상과 무아를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고 감정들이 전부 멸하게 됩니다. 사선은 확실하게 견성성불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끝없는 자비와 지혜가 샘솟는 것입니 다. 사선에 들면 숨결이 멈춥니다. 위대한 선사들을 보면 한 달 씩 선정에 들곤 합니다. 이것은 숨결이 멈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물들을 보면 동면을 하면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 고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숨결이 멈추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숨결이 멈추는 것과 의식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전신을 통해 기를 받을 수 있고 기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나 수행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가 능합니다. 일반 중생은 문을 통해 기가 나가고 들어옵니다. 보통은 기운이 머리 백회혈로 들어와서 발로 나갑니다. 들어오는 만큼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이란 나가는 것을 적게 내보내게 합니다. 기운이 고여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만큼 내보내는 마음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선을 통해 생기는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선정에는 앉는 자세, 복장, 손의 자세, 몸의 자세, 입의 모양, 눈의 자세, 호흡법, 사유(思惟)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방법으로 익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정도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표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법은 입을 열고 기를 뱉어내는 심호흡을 한 두번 한 다음 좌정하는데 몸을 일곱 여덟 번 작게 시작하여 크게 흔들다가 조용히 멈추어서 올올단좌(兀兀端坐)가 됩니다. 호흡은 바람(風), 기운(氣), 헐떡거림, 호흡(息) 네 가지가 있는데, 바람은 소리가 나고 기운은 맺히고 정체하며 헐떡거림은 숨 쉬기가 자유롭지 못하고 호흡은 앞의 세 가지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 중에서도 헐떡거림에 빠지면 피로하고 기운을 쓰면 맺히고 바람은 산란한 마음을 일으키며 호흡은 고요해 집니다. 몸을 여러 번 작게 크게 흔들다가 멈추라고 하는 것은 몸을 꼿꼿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흡은 네 가지가 있는데 잘 못하면 바람, 기운, 헐떡거림이 됩니다. 참선을 하면서 호흡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해야 생각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안정되면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요해지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고 미세한 것들의 움직임을 알게 됩니다. 고요함이란 멍하니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호흡은 배꼽 아래 단전에까지 복식호흡을 합니다. 숨이 들어 갈 때에는 들어가는 숨을 생각하여 여실히 알고, 숨이 나갈 때는 숨이 나가는 것을 여실히 알며, 혹은 길고, 혹은 짧게 일체 입식( 入息)과 출식(出息)을 생각하여 여실히 알며, 휴식(休息), 수행의 입식과 출식을 생각하여 여실히 관(觀)합니다. 단전에 손을 대고 호흡을 쭉 들이 내쉬면 복식호흡이 됩니다. 이런 복식호흡을 생활화되면 평상시에도 조용히 호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깨어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산만하지 않고 집중이 됩니다. 앞에서 나온 설명이 바로 위빠사나에서 호흡을 통해 알아차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아홉 가지 심주는 내주(內住), 등주(等住), 안주(安住), 근주(近住), 조순(調順), 적정(寂靜), 최극적정(最極寂靜), 전주일취(專住 一趣), 등지(等持)입니다. 마지막 등지를 거치면 견성하게 됩니다.
① 내주(內住)란 밖에 있는 일체의 반연하는 경계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단속하여 안에다 두고 밖으로 산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주는 외부의 대상에 마음이 이끌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화두에 들면 외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주의 상태가 되면 ‘이뭣고’가 순일하게 잘 들리는 것입니다.
② 등주(等住)는 최초에 계박된 마음은 그 심성이 거칠게 움직이는 마음(육추)이어서 아직 두루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반연하는 바 경계에 대하여 상속방편과 집중방편으로 꺾어 미세하게 하여 두루 거두어 들여서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이뭣고?’가 들리는 상태입니다.
③ 안주(安住)는 내주, 등주하는 마음을 놓쳐 밖으로 산란하기 때문에 또 다시 거두어 단속하여 내 마음안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이뭣고?’를 드는데 간혹 다른 곳으로 마음이 빠져나가면 이것을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뭣고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안주의 단계입니다.
④ 근주(近住)는 마음을 안으로 머무르게 하여 이 마음이 밖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이뭣고?’가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바깥 경계에 이끌리지 않고 항상 화두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⑤ 조순(調順)은 색성향미촉의 오경과 탐진치의 삼독과 등의 갖가지의 상들이 근심거리가 되어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순리대로 조화롭게 따르는 단계입니다. ‘이뭣고?’ 외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⑥ 적정(寂靜)은 욕, 에, 해 등의 나쁜 심사와 탐욕개등의 수번뇌가 마음을 요동케 하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 즉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오개를 덮어 적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뭣 고?’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의심입니다. 자기 생각에 막혀 다른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⑦ 최극적정(最極寂靜)은 적정의 마음을 놓침으로 해서 나쁜 심사와 수번뇌가 잠시 일어나지만, 곧바로 토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이뭣고?’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⑧ 전주일취(專住一趣)는 가행이 있고 용공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간격이 없어 삼매가 상속하여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이뭣고?’의 삼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정진하여 공덕이 생겨 부족함이 없고, 간격 없이 끝없이 삼매에 머무는 것이 전주일취입니다. 오로지 하나에 머무는 것입니다.
⑨ 등지(等持)는 자주 닦고 자주 익혀 많은 수습으로 인연을 삼기 때문에 가행도 없고 용공도 없게 되어 자연히 도에 들어가 는 것입니다. 선정 삼매에 들어 ‘이뭣고?’를 통하여 본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일취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 삼매에 들어 견성하게 됩니다.
선정에 들면 네 가지 지혜가 저절로 생깁니다. 네 가지 혜행은 내심의 사마타에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법중에 바르게 생각 하여 판단하며, 가장 지극하게 생각하여 판단하며, 빠짐없이 두루 심사하며, 빠짐없이 두루 사찰하게 됩니다.
심주는 사마타를 하면서 생기는 아홉 가지 단계를 말한 것으로, 사마타를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 한 것입니다.-통섭불교]
'대승기신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승기신론 正宗分(정종분)의 수행신심분 7 (1) | 2023.01.14 |
|---|---|
| 대승기신론 正宗分(정종분)의 수행신심분 6 (1) | 2023.01.13 |
| 대승기신론 正宗分(정종분)의 수행신심분 4 (0) | 2023.01.11 |
| 대승기신론 正宗分(정종분)의 수행신심분 3 (2) | 2023.01.10 |
| 대승기신론 正宗分(정종분)의 수행신심분 2 (1) |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