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解行發心(해행발심)
解行發心者(해행발심자) 當知轉勝(당지전승)
해(解)와 행(行)의 발심=解行發心이라는 것은, (신성취발심보다) 더욱 수승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하나니,
以是菩薩從初正信已來(이시보살종초정신이래)
이 보살은 처음 바른 믿음=初正信을 따른 이래,
於第一阿僧祇劫將欲滿故(어제일아승기겁장욕만고)
제1의 아승기겁에서의 (수행이) 장차 원만하게 다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第一阿僧祇劫(제일아승기겁) :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심하여 성불하는 데 3아승기겁이 걸렸다고 하며, 제일아승기겁이란 앞에 나온 신성취발심을 이룬 기간이다.
於眞如法中(어진여법중) 深解現前(심해현전) 所修離相(소수리상)
진여법 가운데서 깊은 이해가 앞에 나타나고, 닦은 바 수행이 그 모습=相을 여읜 것이다.
深解現前(심해현전) : 이해는 하나 증득은 아니다.
[解行發心(해행발심) : 십주와 십행이 원만하여 십회향에서 발심함.
* 지운 : 해행발심에서는 我空과 法空을 체득하고 진여법을 이해하여, 성문과 연각의 경지에 든다. 상사각(相似覺) 발심이다.
* 憨山 : 이 보살은 정신(正信)으로부터 십회향의 마음이 가득 찬 데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제일무수겁을 경유했다면 앞에서 일만 겁을 수행했던 것을 능가하고, 차별적인 모습을 떠난 진여행을 닦는다면 앞의 보살이 십신으로 불상에 공양하고 스님을 공경하면서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하는 것을 능가한다.
이 보살은 일체법이 심식에 상즉한 자성임을 알아 다른 사람을 경유하지 않는 깨달음으로 지혜법신을 성취한다. 그 때문에 분명히 심오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진여법성의 이치를 따라서 집착 없는 수행을 하게 된다.
* 元曉 : 於第一阿僧祇劫將欲滿故 於眞如法中 深解現前이란 십회향의 자리에서 평등공(平等空)을 얻었기 때문에 진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나타난 것이니, 지전(地前)의 일아승기(一阿僧祇)가 차려고 하기 때문이니 이는 해행에서 발심을 든 것이다.-물처럼바람처럼]
[해행발심은 신성취발심보다는 한층 뛰어난 발심이다. 첫째의 신성취발심에서 초발심주(初發心住)에 도달된 보살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 단계 위의 발심수행을 행해나가는 것이다. 해행발심(解行發心)은 십주(十住)에서 십행(十行)의 자리에 나아가 육바라밀(六波羅蜜)의 행을 닦는 발심으로 여기서 수행하는 육바라밀(六波羅蜜)과 진여무상(眞如無相)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 단(檀)바라밀이다. 진여법성에는 애당초 탐내는 간탐심(慳貪心)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알고, 그 법성의 진리에 따라 보시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탐심을 전혀 갖지 않으며 또한 이것이 보시(布施)라고 하는 것 자체까지도 떠나서, 보시를 행할 때 보시바라밀의 완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등무상의 법성에 수순하는 보시바라밀의 행이다.]
[여기에서는 십해와 십행이 원만하여 십회향에서 발심한 것을 밝히고 보다 수승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십해(十解)와 십행(十行)이 원만하여 십회향(十廻向)에서 발심한 자는 십신(十信)보살을 더욱 능가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더욱 능가하는가 하면 이 보살이 최초의 정신지(正信地)로부터 십지(十地)의 초지(初地)인 환희지(歡喜地)에 이르기까지 제1의 아승기겁의 수행을 원만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살은 진여법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난 진여의 이치를 깊게 이해하여 수행하는 것과 그 모습에 대한 집착을 여읜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십신을 성취한 보살은 십신(十信)이 원만하여 십주(十住)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십주(十住) 다음의 십행(十行)이 원만하여 십회향(十廻向)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수승(殊勝)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앞의 보살계위에서는 자리이타의 행을 수행하긴 했으나 그래도 진여법신을 추리로 유추해서 아는 관행(觀行)을 실천하면서 진여의 이치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여에서 다시 나와 세속으로 들어가 회향하였기 때문에 더욱 수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수수한 까닭을 풀이합니다.]
以知法性體無慳貪故(이지법성체무간탐고) 隨順修行壇波羅蜜(수순수행단바라밀)
법성의 자체는 아끼거나 탐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순하여 단바라밀=보시바라밀을 수행하며,
[慳 아낄 간
* 元曉 : 십행의 자리에서 법공(法空)을 얻었기 때문에 법계에 수순하여 육도를 닦는 것이니, 이는 발심에 의거한 해행을 나타낸 것이다.
* 十行(십행) : 환희행(歡喜行), 요익행(饒益行), 무진한행(無瞋恨行), 무진행(無盡行), 이치란행(離癡亂行), 선현행(善現行), 무착행(無着行), 존중행(尊重行), 선법행(善法行), 진실행(眞實行)]
* 지운
| 十信 | 十解 | 十行 | 十回向 | 十地 | 佛 |
| 信成就發心 | 解行發心 | 證發心 | |||
| 人空 | 法空 | 平等空 | 진여가 드러남 | ||
| 외범부,범부각 | 내범부, 이승(초지까지) 상사각 | 수분각 | 구경각 | ||
以知法性無染(이지법성무염) 離五欲過故(리오욕과고) 隨順修行尸波羅蜜(수순수행시바라밀)
법성은 오염됨=染이 없어, 오욕의 허물에서 떠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수순하여 시바라밀=지계바라밀을 수행하며,
五欲(오욕) : 불교에서 경계하는 인간의 5가지 욕망. 재물욕(財物慾), 색욕(色慾), 식욕(食慾), 수면욕(睡眠欲), 명예욕(名譽欲). 흔히 유교의 <예기(禮記)>에 나오는 인간의 감정인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즐거움(樂), 사랑(愛), 미움(惡), 욕망(欲)인 칠정(七情)과 함께 '오욕칠정(五慾七情)'이라 부르며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말로 쓰기도 한다. 오욕은 인간의 다섯 가지 기관인 눈, 코, 귀, 혀, 몸과 관련이 있으며, 빛과 냄새, 소리와 맛, 감촉이라는 다섯 가지 경계에 집착할 때 나타나는 욕망을 말한다. 욕계(欲界)는 사람에게 오욕이 있어 본성에 휘둘리는 세계를 말하며, 색계(色界)는 선(禪)을 닦는 수행자가 다시 태어나는 곳으로 오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빛과 같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고, 무색계(無色界)는 몸과 같은 물질이 없이 ‘정신적 삼매경’이 지속되는 곳이다. 색계와 무색계는 천상(天上)에 속하고, 욕계는 하계(下界)에 속한다.
석가모니는 ‘재색명식수 지옥오조근(財色名食睡 地獄五條根)’이라고 하여, 이 다섯 가지 욕망이 내생에 지옥에 태어나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가르쳤다. 오욕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준 고통은 인과응보에 따라 내생에 자신에게 되돌아 오게 되는데,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가에서는 오욕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수행의 1차적인 목표로 삼는다.-다움백과]
[둘째는 시라(尸羅)바라밀, 즉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이다. 진여법성에는 애당초 번뇌의 염(染)이 없고, 자성이 청정하여 오욕(五欲)의 허물에서 벗어나 있다. 이 무염무욕(無染無欲)의 법성에 수순하여 계(戒)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계(戒)라 함은 악행(惡行)을 제어하는 것으로, 신구의(身口意) 삼업의 악행을 제어하고 십선(十善)을 행하는 것이다. 살생(殺生), 투도(偸盜), 사음(邪淫)의 세 가지 신업(身業)의 악(惡)과 망어(妄語), 양설(兩舌), 악구(惡口), 기어(綺語)의 네 가지 구업(口業) 및 탐(貪) 진(瞋) 치(癡)의 세 가지 의업(意業)을 떠나 십선계(十善戒)를 행함으로써, 오욕(五慾)의 허물에서 떠나있는 무염(無染)의 진여법성에 수순하는 것이다.]
以知法性無苦離瞋惱故(이지법성무고리진뇌고) 隨順修行羼提波羅蜜(수순수행찬제바라밀)
법성에는 괴로움=苦가 없어, 성냄의 번뇌=瞋惱를 떠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수순하여 찬제바라밀=인욕바라밀을 수행하며,
* 羼(찬) : 양이 뒤섞임. 여기서는 음역
[셋째는 羼提波羅蜜(찬제바라밀), 즉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이다. 진여법성에는 애당초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며 미움과 노여움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진여의 본성에 수순하여 인욕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체법의 본성은 진여로서 그 안에는 고(苦)나 진뇌(瞋惱)가 애당초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고뇌(苦惱)를 참고 노여움이나 미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以知法性無身心相(이지법성무신심상) 離懈怠故(리해태고)
법성에는 신심의 모습=상이 없어 게으름=懈怠를 떠나 있음을 알기 때문에,
隨順修行毘黎耶波羅蜜(수순수행비리야바라밀)
수순하여 비리야바라밀=정진바라밀을 수행하며,
[넷째는 비리야(毗梨耶)바라밀로, 즉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이다. 진여법성에는 애당초 심신(心身)의 차별상이 없는 것이며 또한 태만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해태(懈怠)가 진여법성에는 애당초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정진(精進)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게으름 없이 심신을 단련하고 중단 없는 노력으로 수행을 정진해 나가는 것이다. 심신(心身)의 상대적 대립 없이 하나된 심신으로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정진 수행하는 것이다. 어떤 목표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노력 그 자체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노력이 정진바라밀이다.]
以知法性常定體無亂故(이지법성상정체무란고) 隨順修行禪波羅蜜(수순수행선바라밀)
법성은 항상 안정되어 그 자체=體에 산란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순하여 선바라밀=선정바라밀을 수행하며,
[다섯째는 禪波羅蜜(선바라밀), 즉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이다. 진여법성은 본래 안정 그 자체이므로 거기에는 애당초 산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선(禪)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선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진여의 무상무념(無相無念)에 수순하여 선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以知法性體明離無明故(이지법성체명리무명고) 隨順修行般若波羅蜜(수순수행반야바라밀)
법성의 자체=體는 밝아 무명을 여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순하여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般若波羅蜜(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智慧波羅蜜)이다. 진여법성에는 지혜광명이 갖추어져 있어 거기에는 무명이 없는 것이다. 보살은 이같은 진여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순하여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육바라밀 : 壇(dana)波羅蜜 - 보시, 尸(sila)波羅蜜 - 지계, 羼提(ksanti)波羅蜜 - 인욕, 毘黎耶(virya)波羅蜜 - 정진, 禪(dhryana)波羅蜜 - 선정, 般若(prajna)波羅蜜 - 반야
* 해행발심에서의 육바라밀은 진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내가 재물이 아깝지만 아까운 마음을 참고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법 자체에는 인색함과 탐욕이 없음을 이해하여 자연스럽게 보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육바라밀을 신구역(新구譯)에 나타난 용어 및 원어 그리고 현재 사용된 용어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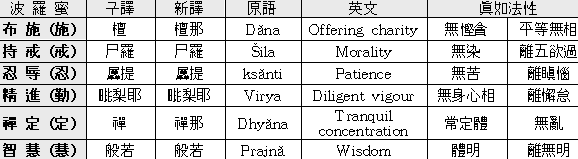
[해행발심보살의 수행은 집착하는 형태를 여읜 수행임을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난 법성의 자체엔 간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성의 이치를 수순하여 보시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은 망상의 오염이 없어 오욕의 허물을 여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성을 수순하여 지계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은 괴로움이 없어 성냄과 번뇌를 여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성을 수순하여 인욕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은 신심(身心)의 형태가 없어 해태를 여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성을 수순하여 정진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은 항상 안정되어 자체에 산란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성을 수순하여 선정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의 자체는 밝아 무명을 여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성을 수순하여 반야바라밀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범어로 빠라미따(Paramit )는 한역하면 도피안(到彼岸)이라고 합니다. 피안(彼岸)이란 구경의 진실한 깨달음의 세계이고 도(到)는 도달한다 또는 이른다·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즉, 생사윤회하는 고통의 세계에서 깨달은 열반의 세계에 이르거나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쉼터이야기
선로(宣老)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선로’란 태어나자마자 노인이란 말입니다. 송나라 때 곽공보(郭功輔)라는 문장가가 있었는데, 곽공보가 임제종의 귀종선(歸宗宣) 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귀종선 선사가 곽공보에게 “내가 너희 집에 6년만 있어도 되겠느냐?”라고 하자 곽공보는 흔쾌히 응낙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선사가 열반에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곽공보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위아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어른인 듯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귀종선 선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감당이 안되는 곽공보는 임제종의 백운단 선사에게 부탁하여 아이를 한번 봐 달라고 합니다. 백운단 선사가 곽공보의 집에 오니까 그를 본 아 이가 “어, 조카 잘 왔네!”라고 합니다. 어리둥절한 백운단 선사는 자기가 귀종선 선사라고 하는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서 대조해봅니다. 놀랍게도 귀종선 선사와 자신만이 아는 이야기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태어난지 6년이 지나자 어느 날 곽공보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 집에 6년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6년이 되었으니 가겠네.” 그러자 평범한 아이로 돌아 왔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전생을 기억하는 것을 격생불망(隔生不忘)이라고 합니다. 티베트의 활불사상(活佛思想)도 이런 것입니다. 전생에 자신만이 아는 무언가를 해놓고 이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것을 찾아갑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런 신기한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시시비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다원과나 사다함과를 얻으면 악처(惡處)에 태어나게 만드는 무기한으로 효과가 있는 모든 업이 소멸된다. 아나함과를 얻으면 욕계의 세계에 태어나는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한으로 효과가 있는 모든 업이 소멸된다. 아라한이 되어 열반을 성취하면 어떠한 세계에 태어나게 만드는 무기한으로 효과가 있는 모든 업이 완전히 소멸한다.” 우리 속에는 세세생생의 업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수다원과를 얻으면 많은 업이 소멸되어 악처에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악처는 지옥, 아귀, 축생을 말합니다. 악처에 태어나지 않는 생명들은 악처보다는 편안하고 좋습니다. 아나함과를 얻으면 욕계 이상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색계, 무색계 이상에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라한이란 열반적정의 상태를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불교의 사법인은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 열반적정입니다. 앞의 세 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속성입니다. 이것의 본질, 즉 연기를 인식하고 터득하면 열반적정의 상태가 됩니다. 선정에 들어서 보는 세계가 열반적정의 세계입니다. 아라한이 되면 열반적정의 상태가 되어 어떠한 몸으로도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무기한이란 언젠가 인연이 부딪히면 업이 발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업들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에 태어나지 않고, 욕계에 태어나지 않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됩 니다.
“유익한 업의 금생 과보를 받을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대상의 성취이다. 보시를 받는 사람은 멸진정에 들 수 있는 아라한이나 아나함이어야 한다. 둘째 생필품의 성취이다. 보시 할 물건은 법에 따라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셋째 의도의 성취이다. 보시자의 의도는 순수해야 한다.” 보통은 현생에 과보를 지으면 내생에 받는데 현생에 과보를 지으면 현생에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를 받는 사람이 아라한이나 아나함 이상의 상태여야 합니다. 멸진정은 선정에 드는 순간을 말합니다. 선정은 지속적으로 계속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는 보시하는 물건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지나가다 주운 물건이나 남에게서 빼앗아서 준 물건은 효과가 없습니다. 보시를 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물건이어야 보시의 효과가 금생에 나타납니다. 셋째는 보시자의 의도가 순수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보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통섭불교.
'대승기신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승기신론 正宗分(정종분)의 解釋分(해석분) 44 (1) | 2023.01.07 |
|---|---|
| 대승기신론 正宗分(정종분)의 解釋分(해석분) 43 (1) | 2023.01.06 |
| 대승기신론 正宗分(정종분)의 解釋分(해석분) 41 (1) | 2023.01.04 |
| 대승기신론 正宗分(정종분)의 解釋分(해석분) 40 (0) | 2023.01.03 |
| 대승기신론 正宗分(정종분)의 解釋分(해석분) 39 (1) | 2023.01.02 |
